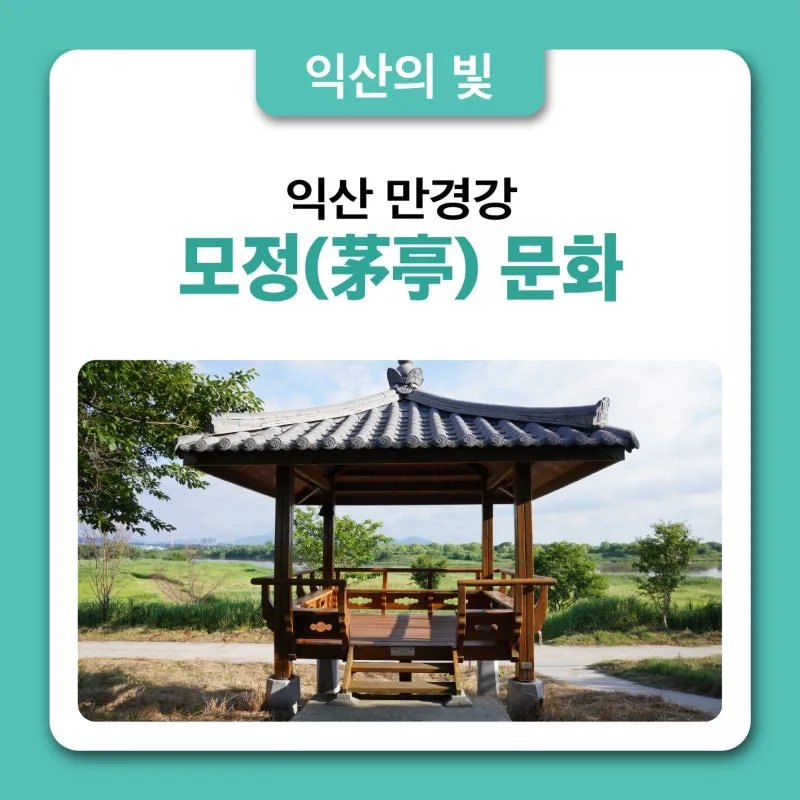3시간 전
익산 만경강 모정(茅亭) 문화
만경강 익산 구간 제방길을 걷다 보면 많은 모정(茅亭)을 만나게 됩니다.
모정 문화는 전라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인데요.
만경강 제방길에 있는 모정을 중심으로 강변 마을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장연마을
익산 만경강 주변 모정(茅亭)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춘포면에 있는 장연마을입니다.
장연마을은 익산천 동쪽에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만경강 개수 공사를 하기 이전에는
긴 연못(장연)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마을 이름도 장연입니다.
만경강 개수공사하면서 봉개산(49m) 북쪽을 돌아 흐르던 익산천은
장연을 가로질러 만경강으로 흐르도록 물길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농지 정리가 되면서 장연은 마을 옆에 작은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장연마을 안쪽에 낡은 모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느 마을에서 보는 모정과 달리 건물 위에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모정에는 중수기가 있는데요.
모정 이름은 영벽정(映碧亭)입니다.
昭和 14년(1939년)에 다시 지은 건물입니다.
보통의 모정의 경우 현판이 없는데요.
장연마을 모정은 이름이 있는 것을 보면 현판도 걸려 있었겠습니다.
현재는 마을 회관을 사용하면서 모정은 먼지가 두껍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장연마을에서 만경강 방향으로 조금 더 가면 사천마을이 있습니다.
만경강 제방 도로 바로 바깥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사천마을은 직강화 하기 전에는 마을 일부가 현재의 강 안쪽에 있었습니다.
김제, 전주 사람들이 나루를 이용해서 사천으로 건너와
번드리, 선들을 통해 금마로 이동하던 길목이었습니다.
삼례 쪽보다 강 깊이가 낮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강을 넘어 다녔습니다.
만경강 제방 도로 옆에는 새로운 모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정에 올라서 바라보면 만경강 풍경이 일품입니다.
이곳 사천마을 앞 만경강은 판문마을, 어전마을 앞
강변과 함께 모래찜질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타 지역에서 기차를 타고 와서 대장촌역에서 내려
이곳까지 이동해서 모래찜질을 즐겼던 곳입니다.
건축 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무분별한 모래 채취를 하면서
모래찜질 문화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익산천 합수부
사천마을 앞 제방도로를 따라 이동해서 익산천을 건너면
만경강과 익산천이 만나는 합수부입니다.
이곳에 서면 만경강 풍경에 매료됩니다.
삼례 방향에서 흘러오는 시원한 강줄기가 한몫하고요.
전주 시내와 모악산으로 이어지는 풍경 또한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전망대 양식의 현대식 구조의 모정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다른 전통적인 모정(정자)과 차이가 있지만
기능상으로 보면 동일하게 보아도 되겠습니다.
이곳도 모래찜질 장소로 유명했지만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습니다.
강 안쪽은 논으로 바뀌었다가 농사가 금지되면서 현재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상수도 수원지인 집수정이 여럿 있었습니다.
삼례 집수정의 대체 시설이었습니다.
현재는 사라지고 그중 하나가 원형 광장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강바닥이 모래층으로 되어 있어 자연 정수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집수정은 1970~90년대까지 사용했습니다.
익산천 합수부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판문마을입니다.
판문은 판자로 만든 대문을 말합니다.
판문마을에는 대장교회 첫 예배당이 있던 터가
교회 역사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경강은 개수공사(직강화) 하기 전에는
제방 바깥에 있는 판문마을 앞을 지나 흘렀는데요.
제방을 쌓으면서 옛 강 물길이 잘려 나갔습니다.
희미해졌던 물길 흔적을 복원해서 만경강 옛 강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중촌마을을 지나 한참을 가면 만경강을 가로지르는 구담교가 나옵니다.
구담교 직전에 보이는 마을이 중촌마을입니다.
판문마을 앞을 지나온 만경강 옛 강은 중촌마을 앞을 경유해서
강 건너편에 있는 구담마을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경로당 앞 옛 강에 놓인 다리 부근이 세천(호소카와)농장과
금촌(이마무라)농장의 쌀을 군산으로 운반하던 부두 역할을 했습니다.
구담마을은 만경강 직강화 공사를 하면서
강 남쪽 제방 아래에 있는 강남마을이 되었습니다.
구담마을을 가기 위해서는 새로 놓인 구담교를 건너게 됩니다.
구담교가 준공되기 이전에는
바로 아래쪽에 물길을 건너는 작은 잠수교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새강다리라 불렀습니다.
만경강 개수공사(직강화)를 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강에 놓인 다리라는 의미였습니다.
새강다리는 구담교 준공 이후에 철거되었습니다.
신촌마을은 일제강점기 농장이 들어서면서 생긴 마을입니다.
마을에는 금촌(이마무라)농장과 세천(호소카와)농장이 운영한
벼를 도정했던 대장공장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신촌마을. 중촌마을은 전주 지역이었고,
반면에 중촌마을 옆 회화마을은 익산 지역이었습니다.
회화마을에서는 회화장이 섰습니다.
모정(茅亭) 이야기
신촌마을을 지나 내려가면 춘포정 모정이 나옵니다.
주차장 건너편에는 춘포문학마당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책하면서 돌에 새긴 문학 작품을 감상하도록 꾸민 곳입니다.
춘포정 현판 글씨는 윤흥길 소설가 작품입니다.
강 안쪽에 신원마을이 있었으나 만경강 개수공사로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모정 문화는 전라도 지방에 두드러지게 발달되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전남에 비하면 전북이 많고,
산간 지역보다는 평야 지역이, 도서 해안지대보다는 내륙지역에 더 많습니다.
모정 문화는 공동체 생활의 산물입니다.
벼농사가 발달된 전라도의 경우 수리시설 관리,
모심기, 김매기, 추수까지 공동으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모여서 논의하고, 일하다 쉬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모정이었습니다.
모정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는 모정이라 부르지만 타 지역에서는 모정 외에도 시정(詩亭),
우산각(지붕이 우산과 닮았다고 해서 부르는 이름),
농정(農亭), 농청(農廳), 량청(凉廳) 등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모정은 여름철에 더위를 피해 휴식하기 위한 건물로 방이 없고 마루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유는 마을 공동체 공유가 일반적이지만 특별히 사유 건물이면서
마을 구성원에게 개방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사일을 하다가 쉬는 장소였기 때문에 모정은 남자들의 공간이었습니다.
모정의 구조는 사각형이 일반적이지만 드물게 육각(육모정), 팔각(팔모정)도 있습니다.
모정은 마을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위세를 과시하는 과정에서 육모정과 팔모정이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경강 제방에는 사각, 육각, 팔각 모정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유천정은 팔모정입니다.
모정의 지붕은 본래 짚으로 이은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매년 지붕을 다시 해야 하는 부담과 공동체 건물을 단장하려는 욕구가 맞물려
기와나 함석, 슬레이트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만경강변에서 만난 모정의 경우 장연마을 모정은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지만 강변에 새로 설치한 모정의 경우
기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정(茅亭)은 정자(亭子)와 형태가 비슷하지만 기능상 차이가 있습니다.
모정은 농민의 문화라면 정자는 선비 문화입니다.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정자를 짓고,
손님 접대를 하고 풍경 감상과 풍류를 즐기는 장소로 활용했습니다.
만경강을 돌아보며 제방 도로 옆에 있는 모정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정은 전라도에서 볼 수 있는독특한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익산 관내 만경강 제방에는 17개(장연마을 포함)의 모정이 있는데요.
만경강을 찾는 모든 사람의 편안한 쉼터가 되어줄 것입니다.
#익산모정문화 #만경강제방길 #익산역사답사 #전라도모정기행 #익산마을이야기 #익산산책코스 #익산모정여행 #2025여름여행추천 #전북문화유산 #익산로컬여행
#익산도보여행 #전북풍경사진 #익산명소기록 #모정문화탐방 #익산마을유래 #익산문화콘텐츠 #익산춘포정 #익산역근처가볼만한곳 #전라북도걷기좋은길
- #익산모정문화
- #만경강제방길
- #익산역사답사
- #전라도모정기행
- #익산마을이야기
- #익산산책코스
- #익산모정여행
- #2025여름여행추천
- #전북문화유산
- #익산로컬여행
- #익산도보여행
- #전북풍경사진
- #익산명소기록
- #모정문화탐방
- #익산마을유래
- #익산문화콘텐츠
- #익산춘포정
- #익산역근처가볼만한곳
- #전라북도걷기좋은길